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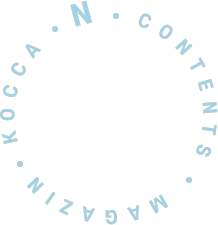
KOCCA NKOCCA 키워드
소비 취향의 다양성과 서브컬처 Vol. 34
#콘화위복, 콘텐츠플레이션이 알려준 글로벌 성공의 길
‘콘화위복’은 콘진원이 꼽은 2024 콘텐츠산업 전망 키워드 중 하나다. 콘텐츠플레이션(콘텐츠 이용과 제작의 물가 상승)을 극복하는 것은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의미. SK 브로드밴드 조영신 경영전략그룹장은 이럴수록 K-콘텐츠산업이 위축되지 말고 큰 제작비를 들여 글로벌 성공을 노리는 것이 ‘콘화위복’이라고 생각한다.
 ©Shutterstock
©Shutterstock
시장이 어렵다. 광고 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채널은 제작 편수를 줄였고, 가격이 비싸다는 핑계로 OTT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편수를 줄였다. 한번 줄어든 수요가 어지간해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엔데믹(Endemic)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영화 시장의 모습이 내일의 방송 시장일 수도 있다. <정년이> 등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는데 무슨 한국 콘텐츠 시장의 위기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수백 광년 지난 과거의 빛이 오늘 지구에 도착하듯, 2~3년 전에 기획한 콘텐츠가 지금 나올 뿐이다. 오늘 기획하고 준비하는 콘텐츠의 수가 줄었고, 일거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제작사들의 숫자가 늘어나니 2~3년 뒤의 방송 시장의 모습이 어떨지 가늠이 된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다. 위기다 싶으면 일본 시장이 열렸고, 또 위기다 싶으면 중국 시장이 열렸었다. 이제는 물리적으로 확장할 시장이 없다. 글로벌 OTT 주도 시장에선 ‘화성’이면 모를까 우리가 개척해야 할 시장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숏폼 드라마 플랫폼 ‘탑릴스’를 통해 공개된 숏폼 드라마들.
숏폼 드라마 플랫폼 ‘탑릴스’를 통해 공개된 숏폼 드라마들.
ⓒ탑릴스
숏폼 드라마는 콘텐츠 시장을 살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아랫 시장이 열렸다. 바로 숏폼(Short Form) 드라마다. 중국과 북미에서만 열린 시장이다. 중국은 지불 장벽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규제가 없어 새로움을 갈구하는 청년 세대를 불러 모았다. 북미의 릴쇼츠(Reel Shorts)는 3~40대 중년 여성의 호주머니가 열었다. 두 시장에선 숏폼 드라마 제작사들도 제법 돈 맛을 보았다. 이를 본 국내외 벤처 캐피탈과 투자자들이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기반해서 글로벌 숏폼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장을 탐색하더니, 2024년 4월 선보인 ‘탑릴스(Top Reels)’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1,200억 원 투자를 받은 ‘비글루(Vigloo)’가 문을 열었고, 9월엔 왓챠가 숏품 드라마 플랫폼인 ‘숏차(Shortcha)’ 서비스를 개시했다. 25년에는 리디북스를 비롯해 10여 개의 숏폼 드라마 플랫폼이 투자를 기대하며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그리고 향후 나올 숏폼 드라마의 숫자는 대략 300~500여 편에 이른다. 제작 비용도 타이틀당 5천만 원 전후부터 시작해 1억~1억 5천만 원을 평균값으로, 그리고 IP를 보유한 소수의 사업자는 3억 원 정도의 제작비를 받는 경우도 생겼다. 제작 기간은 평균적으로 1주일 이내다. 유명 촬영 감독도 아르바이트 삼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참여하는 제작사들의 폭도 넓다. 디지털 마케팅을 하던 제작사나 디지털 광고 회사 그리고 웹드라마 제작 업체도 시장에 진입했다. AI로 이 시장을 뚫어 보겠다는 기술 업체도 등장했다. 레거시 드라마 제작사들도 이 시장에 들어왔다. 작게는 편당 수억, 많게는 수십억이 드는 드라마만 만들던 ‘위세 높은’ 제작사들도 춘궁기에 손을 놀릴 순 없어 숏츠 플랫폼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시장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자원의 활용이라는 의미로 한두 번 참여해 트렌드를 익히는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레거시 사업자들이 이 시장을 뚫어 새로운 활력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문법부터 다른 시장이기에 새로운 작법과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올인하지 않는다.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작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드라마를 내놓겠다는 의지로 오늘도 기획 회의를 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숏츠 드라마 시장은 한번 거쳐갈 수는 있으나 레거시 사업자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K-콘텐츠산업은 지금 꾸준히 오르는 제작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K-콘텐츠산업은 지금 꾸준히 오르는 제작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Shutterstock
실구멍만 열려있는, 그래서 확률은 낮은 게임
윗 시장의 문은 더 좁아졌다. 그 좁은 문조차도 이력을 가진 대형 사업자들이 길목을 잡고 있으니 중소 사업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tvN이 25년도 제작 편수를 늘린다고 하면 스튜디오드래곤 정도만 겨우, 그것도 숨통만 틀 뿐이다. 현재 채널 사업자의 사업 모델로는 증가된 제작비를 맞출 수가 없다. 여기에 제작비의 상당 부분이 주요 배우의 출연료 때문이라는 주장이 슬며시 얹혔다. 결국 정리하면 주요 배우의 출연료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제작비가 올랐고, 그래서 채널 사업자들이 제작 편수를 줄였다는 스토리가 만들어졌다.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배우가 3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는 작품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기에 이르렀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긴 어딘가 석연치 않다. 영화 시장이든, TV 시장이든, 영상이 하나의 사업이 된 이후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작품의 제작비가 감소한 적은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작비와 글로벌 흥행과의 관계다.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글로벌 인지도 높은 배우 등 제작비를 높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제작비 하락이 오히려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한 유일한 K-드라마,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한 유일한 K-드라마,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K-콘텐츠, 아직 글로벌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 한국 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콘텐츠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반드시 나온다.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상 콘텐츠가 세상의 모든 곳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는 이가 분명히 있다. 이들에겐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글로벌 1위를 기록한 우리 콘텐츠는 <오징어 게임>뿐이고, <더 글로리>처럼 각광받은 작품도 비영어권 1위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한국형 좀비’라던 <킹덤>이나 <미스터 션샤인>은 비영어권 1위도 못했다. 이 맥락에서 한국 영상 콘텐츠의 제작비 논쟁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영어권 1위를 기록한 <눈물의 여왕>의 제작비와 매출액을 보자. 김수현이 편당 3억 원으로 출연료를 맞춰주었다곤 하지만 총 제작비가 대략 600억 원이나 되는 대작이다. 흥미로운 건 넷플릭스가 지불한 방영권 금액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니라 라이선스 콘텐츠인데 불구하고 제작비의 약 80%를 방영권으로 지불했다고 알려져 있다. 넷플릭스는 왜 방영권 구매에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려고 했을까? <눈물의 여왕>의 자막 숫자를 보면 그 단초를 조금은 찾을 수 있다. 더빙은 영어뿐이지만, 자막은 히브리어를 포함해 총 3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인 <MR. 플랭크톤>이 약 30개국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물의 여왕>은 오리지널 콘텐츠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300억 원대 규모의 <정숙한 세일즈> 역시 라이선스 콘텐츠인데도 불구하고 대략 30여 개국의 자막을 제공한다. 반면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10개국 자막만을 제공하고 있고, 최근 수급해 방영하고 있는 2022년작 <월수금화목토>는 겨우 한국어와 영어만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TOP10에 이름을 올린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도 한국어와 영어만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용과 국제용을 명확히 넷플릭스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물의 여왕>은 제작비가 커지면 글로벌 성공 확률도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눈물의 여왕>은 제작비가 커지면 글로벌 성공 확률도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tvN
<미스터 션샤인>에 43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었고, <눈물의 여왕>에는 약 6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 <미스터 션샤인>은 비영어권 1위를 기록하지 못했고, <눈물의 여왕>은 비영어권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시청 시간 3위를 기록했다. 제작비 증분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었다. 늘어난 비용만큼 글로벌 성공과 가까워졌다. 글로벌 성공이란 관점에서만 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1,600억 원을 투입했으나, 시청 시간 5위를 기록한 <The Gentlemen>보다도 <눈물의 여왕>이 싸다. 글로벌 성공 확률만 높인다면 우리 콘텐츠의 제작비는 아직 상승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대규모 제작비를 통한 글로벌 성공은 꼭 가야 할 길
지금 한국 콘텐츠의 위치는 애매하다. 제작비 상승과 그에 걸맞는 품질 향상으로 아시아 시장의 주류가 된 한국 콘텐츠다. 다만 아시아와 글로벌의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제작비를 높인다면 글로벌에 가까워질 것이고, 제작비를 낮춘다면 아시아와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보다 제작비가 낮은 일본 콘텐츠는 아시아도 넘지 못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정도의 금액이 투입된다면 과거보다 더 글로벌 구독자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넷플릭스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막힌 길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돌아서라도 가야 한다.
글. 조영신(SK 브로드밴드 경영전략그룹장, P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