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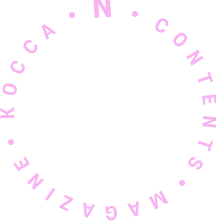
Special NN스토리 3
‘콘덕’과 함께 성장하는 K-콘텐츠 Vol. 33
오늘의 K-드라마를 만든 K-드라마 팬덤의 진화
K-드라마가 지금의 글로벌 인기를 누리게 된 원인으로 ‘팬덤’을 빼놓을 수 없다. 특유의 까탈스러움으로 한국 드라마를 ‘K-드라마’의 지위로 올려놓은 국내 드라마 팬덤은 이제 해외 팬덤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글로벌 감수성을 체득하며 진화하고 있다.
 ©Shutterstock
©Shutterstock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23년간 방영됐던 MBC <전원일기>가 종영하게 된 건 더 이상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농촌의 풍경이 현실이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이들이 급증했고, 이미 농촌조차 90년대부터 서서히 전원 도시로 변모했다. 당연히 라이프스타일도 바뀌었다. 시청자들은 어딘가 구닥다리 같은 시골의 삶보다는 도시의 세련된 삶을 보고 싶어했다. 이런 요구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다. 도시 남녀의 트렌디한 삶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트렌디 드라마’가 쏟아져 나왔다. <질투>부터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별은 내 가슴에> 같은 드라마들이 그 사례다. 이 드라마들은 과거 신파적 스토리를 가진 멜로드라마와는 달리, 소비적인 도시 생활을 무대로 한 가벼운 사랑 이야기로 채워졌다. 시골의 삶에서 도시의 삶으로 옮겨가고, 신파적 눈물의 서사에서 가벼운 웃음의 서사로 바뀌게 된 건 당대 한국 시청자들의 달라진 욕망이 투영된 결과였다. 이 드라마들은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류 드라마’가 태동하게 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드라마 <질투>
드라마 <질투>
©MBC
OTT와 함께 글로벌 드라마 시장이 열리다
그런데 트렌디 드라마는 그 후로도 승승장구했을까? 아니다. 한동안 트렌디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생각만큼 한국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한국 시청자들은 이제 현실성이 결여된 적당한 배경을 채워놓고 그려나가는 가벼운 멜로가 식상해졌다. 그래서 병원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연애만 하는 드라마들을 ‘무늬만 의학 드라마’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즈음 안판석 감독이 일본 원작을 리메이크한 <하얀 거탑>이 방영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디테일’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를 채워주었다. 이후 ‘전문직 드라마’ 시대가 열렸다. 의사와 변호사 같은 직업군은 물론이고 요리사, 호텔리어 등등 다양한 전문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들이 쏟아졌다. 물론 여전히 신데렐라 스토리를 담은 멜로 드라마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드라마 <하얀 거탑>
드라마 <하얀 거탑>
©MBC
당시 멜로의 대가인 김은숙 작가도 변화를 시도했다. <온에어>와 <시티홀> 같은 작품은 전문직의 세계가 더해진 멜로드라마였다. 그 후 <태양의 후예>,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 김은숙 작가는 멜로와 다양한 장르들을 엮어냈는데 이것 역시 OTT의 등장으로 글로벌 시대가 열리면서 장르물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의 시청자들은 까다롭고 금세 질려하고 새로운 걸 계속 요구한다. 그래서 성공한 드라마의 방정식은 그 공식이 나온 후에 따라 하게 되면 이미 지나간 트렌드가 되기 일쑤였다. <전원일기>가 종영하고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갯마을 차차차>, <동백꽃 필 무렵>, <나쁜 엄마>, <웰컴 투 삼달리>처럼 다시 시골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련의 드라마들이 등장하고 있다. 도시의 삶에 지친 한국 시청자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드라마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K-드라마가 나오기까지 그 상당 지분은 한국의 까다로운 시청자들이 갖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드라마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
©tvN
 드라마 <미스텨 션샤인>
드라마 <미스텨 션샤인>
©tvN
K-드라마 만든 K-팬덤, 그 탄생과 변화
한국 시청자들에게 드라마는 일상에 맞닿아 있는 장르다. 과거에는 집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틀어 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누구나 한 마디씩 얹기 좋은 장르고, 또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의 물꼬를 트는 데도 이만한 게 없다. 드라마 이야기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만만함은 시청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좋은 틈을 만들어줬다.
9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진행된 디지털 혁명은 이렇게 저마다 수다로 휘발되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터넷으로 결집시키는 힘을 발휘했다. 그 목소리들은 이제 하나의 여론이 되어 제작자들에게 압력을 미쳤다. 심지어는 방영 도중 주인공이 바뀌거나 스토리 전개가 바뀌게 될 정도였다. 특히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민주화 과정을 겪은 대중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인터넷은 그 목소리를 더욱 결집시키는 장이 되어주었다.
그러면서 디지털 공간은 저 너머의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같은 당시 우리보다 앞서 있던 해외 드라마들을 섭렵하게 했다.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미국 드라마가 국내 방송사에서 소개되기도 전에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됐고, 심지어 미국 드라마는 ‘미드’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마이클 스코필드는 한국식 이름 ‘석호필’을 갖게 됐다. ‘일드’도 마찬가지였다. <노다메 칸타빌레>나 기무라 타쿠야 주연의 <롱 베케이션> 같은 일본 드라마가 한국 시청자들의 눈을 높이면서 좀 더 세련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요구도 거세졌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단단해진 K-드라마는 충분한 자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OTT와 만나면서 드디어 저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오징어게임>이 글로벌 성공을 거뒀고, <킹덤> 같은 독특한 좀비물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 드라마는 OTT를 만나며 글로벌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오징어게임> 포스터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는 OTT를 만나며 글로벌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오징어게임> 포스터들
©넷플릭스
K-드라마 팬덤, 세계로 확장되다
OTT를 만난 K-드라마의 팬덤은 이제 국내만이 아닌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팬덤과 해외 팬덤 사이의 갭도 생겨났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대자본으로 만들어진 다소 자극적인 판타지 장르물의 경우 그 호불호가 갈리는 경향이 크다. 국내 드라마 팬들은 <스위트홈> 같은 판타지 장르가 워낙 새로워 처음에는 열광했지만 시즌을 거듭할수록 자극적인 흐름에 지쳐갔다. 제작진들도 국내 팬덤만이 아닌 글로벌 팬덤을 겨냥하는 경향도 생겼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내놓은 모완일 감독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같은 작품은 ‘세련된 스릴러’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에서는 좋은 반응들이 나왔지만 국내 팬덤에서는 괜찮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국내 드라마 팬들은 그간 OTT의 등장으로 지나치게 판타지화하고 자극적으로 변한 K-드라마에 식상함을 느끼고 오히려 ‘순한 맛’ 드라마를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앞서 언급한 시골향 드라마들이 다시 등장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류의 드라마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tvN
이처럼 국내 팬덤과 해외 팬덤 사이에 정서적 차이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OTT가 가진 글로벌 가능성을 밑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선재 업고 튀어>가 바로 그것이다. 국내에서는 최고 시청률이 5%에 머물렀지만, 이 작품은 OTT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방영됨으로써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강력한 코어 팬덤이 형성됐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K-팝 아이돌인 선재(변우석)와 그의 열성 팬인 임솔(김혜윤)이 만들어가는 판타지 로맨스를 통해 마치 K-팝 팬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흐름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코어 팬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이것이 라이트 팬덤으로 이어지면서 <선재 업고 튀어>는 방영 후에도 변우석이 아시아 투어를 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게 된 K-드라마는 국내 팬덤과의 관계만이 아닌 해외 팬덤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서적 차이로 인한 호불호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로컬 사회의 정서적 틀에 묶여 있던 국내 팬덤들도 글로벌 감수성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팬덤이 가진 로컬의 정서 또한 글로벌 팬덤에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K-팬덤은 로컬과 글로벌 정서가 부딪히고 화학작용을 내는 새로운 장이 되고 있다.
글. 정덕현(대중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