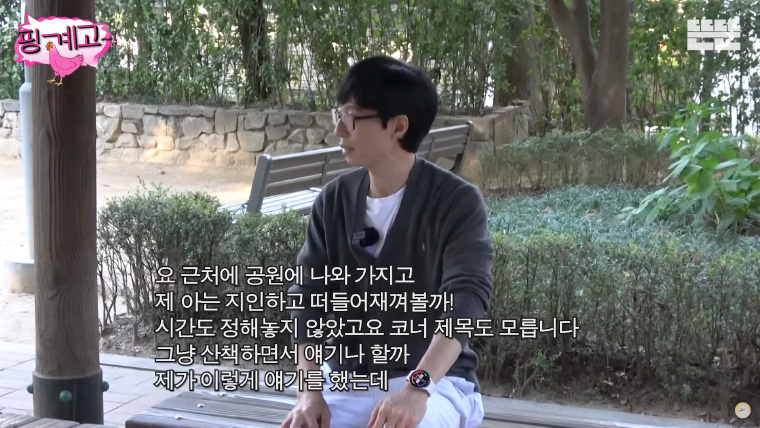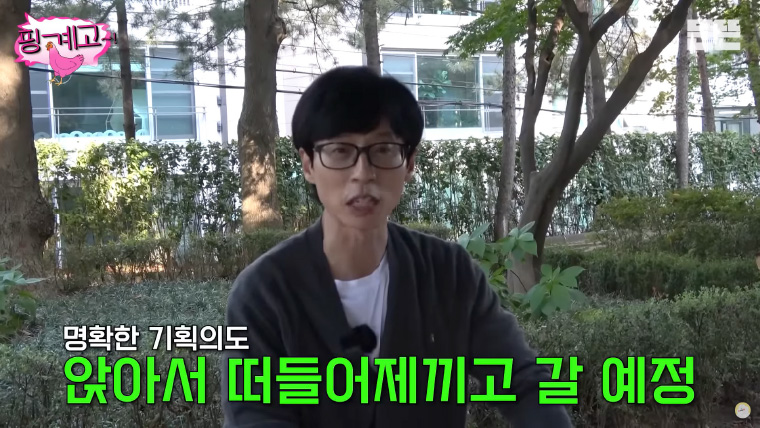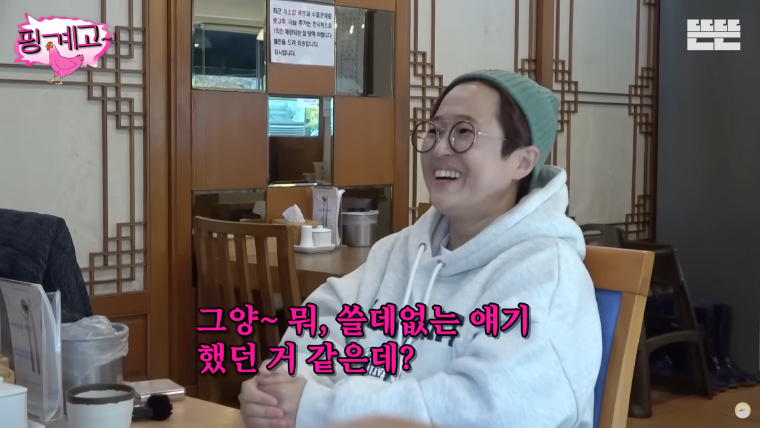유튜브 <핑계고> 시리즈가 긴 영상 길이에도 불구하고 연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기존 예능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콘텐츠라는 점, 영상을 틀어두고 다른 일을 하며 감상하는 콘텐츠 소비 형태의 확산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핑계고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본다.
<핑계고>의 신선한 매력
유재석이 별의별 핑계를 만들어 ‘찐친’들을 불러 모아 신나게 웃고 떠는 콘셉트의 유튜브 콘텐츠 <핑계고> 시리즈가 화제다. 유재석의 소속사 산하 제작 스튜디오인 안테나플러스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비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로드할 때마다 수백만 뷰 조회수가 터진다. 유튜브 초창기 성공 방정식이 ‘정기적인 업로드’, ‘1일 1 콘텐츠 제작’이라고 알려질 만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규칙성과 빈도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물론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인 유재석의 브랜드 파워가 유튜브에서도 통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핑계고>의 초반 론칭 과정에서 유재석과 제작진이 제시한 기획 의도를 보면, TV 진행자이자 방송인인 유재석이라는 인물을 ‘지향점 없이 그냥 떠들어제끼는’, ‘콘셉트 없음’을 콘셉트로 만든 과감하고 흥미로운 기획임을 알 수 있다.
정해진 콘셉트 없이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콘텐츠인 <핑계고> 시리즈
출처: 뜬뜬 유튜브 채널‘무맥락’ 토크 표방
우선 대한민국 코미디언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유재석의 개그맨이자 재담꾼으로서의 역량을 잘 활용한 기획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핑계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유재석은 “엄청난 명창이신 분들을 우리가 소리꾼이라고 부르지 않나. 저희끼리는 공식적인 오피셜 명칭은 아닌데 그냥 토크꾼, 재담꾼(이라고 한다). 재담꾼 한 분과 함께 토크를 떠들어 보겠다”라며 자부심을 내보였다. 스탠드업 코미디나 공개 코미디 쇼 같이 정교한 이야기 구성이나 극적 설정 없이 시작부터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무맥락’ 토크를 하겠다는 기획 의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예능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시청자들이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하이엔드(High end) 콘텐츠인 TV 프로그램이 아닌 유튜브로 자꾸만 이동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제되지 않는 날것의 이야기와 형식, 포맷의 구애를 받지 않아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기획되기 때문이다. 유재석을 포함한 재담꾼들이 ‘오디오 사고’ 수준으로 쉴새 없이 떠들고 충돌하는 모습은 기존의 틀을 깨는 재미 요소 중 하나다.
‘유재석 복지 콘텐츠’라는 콘셉트의 매력
‘편안한 사람들과 신나게 떠들고 싶다’는 유재석의 사적 욕망을 유튜브답게 포장한 점은 <핑계고>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이다. 유재석의 절친 모임인 ‘조동아리’만 보더라도 유재석이 얼마나 남들과 어울려서 웃고 떠드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중들이 생각하는 유재석의 이미지는 철두철미한 자기관리로 사건 사고가 없는,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지닌 유명인이다. ‘유느님’이라는 애칭은 유재석이 단순히 인기 코미디언이라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는 인물이라는 위상을 보여준다.
그런 유재석이 찐친들을 만나 신나게 떠들어제끼는 편안한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간다. <핑계고>에서는 출연자 모두가 신나게 즐기는 모습이다. TV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시시하지만 웃기는 에피소드들을 쉴 새 없이 떠들며 자기들끼리 재미있어서 자지러진다.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그냥 만든 콘텐츠로, 대놓고 ‘유 선배 복지 콘텐츠’를 표방하는 솔직한 방향 또한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조회수 폭발의 비결인 찐친과 뜻밖의 핑계
유튜브 콘텐츠다운 제작 시스템, 소규모의 제작진 구성과 소박한 장비를 활용한 촬영, 세트 대신 기획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녹화 등도 신선하고 흥미로운 요소다. 특히 찐친을 섭외하기 위한 핑계가 기발하다. <산책은 핑계고>, <몸보신은 핑계고>, <조찬모임은 핑계고>, <설 연휴는 핑계고>, <가짜의 삶은 핑계고> 등의 제목을 보면, 녹화 상황과 출연자와의 관계성을 잘 녹여내 절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만든다.
방향도 목적성도 없이 시작한 영상에 구독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지석진, 송은이, 홍진경 등 유재석의 절친들로 시작한 <핑계고>는 기본적으로 200~300만 뷰 이상의 높은 조회수를 자랑한다. ‘컨텐츠랩 비보’ 대표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30년 절친 송은이를 몸보신시켜주겠다고 초대해 신나게 떠들어제낀 <몸보신은 핑계고> 편은 595만 뷰, 10년 전부터 ‘밥 사주겠다’는 말만 하고 약속을 못 지켰다던 배우 이동욱을 초대한 <설 연휴는 핑계고> 편은 700만 뷰가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

<핑계고> 시리즈의 영상 조회수는 평균 200만 회 이상이다.
출처: 뜬뜬 유튜브 채널
안테나 산하의 제작 스튜디오라는 특성
<핑계고>를 기획한 제작진들은 tvN에서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했던 PD들이다. 레거시 미디어의 성공 문법을 알고 있는 제작진들이 유튜브에서 레거시 미디어의 거물 출연자와 결합해서 내놓은 콘텐츠가 <핑계고>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포맷, 편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민국 엔터산업의 최정점에 있는 출연자 유재석이라니. 정말 비현실적인 기획이 아닐 수 없다. 지상파 디지털 제작 파트에서 유튜브용 콘텐츠에 유재석 같은 출연자를 섭외하기는 힘들다. 비싼 출연료를 상쇄할 만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핑계고>는 유재석의 소속사인 안테나에서 자체 제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기획이라 생각된다. 시간, 장소, 대화 주제 등에 제약 없이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기가 용이하고, 제작진도 호스트의 특성과 개성에 집중해서 콘셉트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을 거라 추측해 본다.
무심한 편집과 롱폼 포맷의 매력
<핑계고>의 차별점은 편집에서도 드러난다. 거의 무편집인 듯 보이는 편집 방식이 시선을 끈다. 출연진들이 한자리에서 30~40분 동안 수다 떠는 걸 그대로 담아내는 듯 보이는 자연스러운 편집이나, 2023년 1월 1일 아침 7시 라이브 방송에서 김 서린 카메라를 닦는 컷을 섬네일로 그대로 사용하고, 특히 날것 같은 토크를 제대로 살려주는 편집 스타일과 자막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1분 이내 숏폼이 대세인 요즘, 롱폼으로 제작하는 유튜브 인기 웹 예능들의 분량이 일반적으로 10~15분인데 반해 <핑계고>는 기본적으로 30~40분 이상의 길이를 가진 에피소드다. 구독자들은 지루하다기 보다는 재밌다는 반응이다. 유튜브 영상을 틀어두고 일상생활을 하는 콘텐츠 소비 형태에 익숙해진 구독자들은 유재석과 친구들의 폭발적인 토크를 반기는 분위기다.
“ 이 채널 딱 밥 친구, 화장 친구임. 굳이 집중해서 하나하나 안 봐도 되고 밥 먹거나 화장할 때 틀어놓고 옆 테이블 사람들 수다 떠는 거 엿듣는 느낌”
“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틀어놓고 씻으면서도 보고 아침밥 먹으면서도 보는데, 오디오가 비워지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 흘깃흘깃 들으면서 할 일 할 수 있는 게 딱 좋음. 유튜브계의 라디오임”
<핑계고>영상들에 달린 댓글이다. 개인적으로는 “목표나 지향점 쫓아 살기 바쁘고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표나 지향점 없이 이렇게 떠들어제끼는 영상이 힐링이다”라는 구독자 댓글에서 <핑계고>의 높은 조회수의 비결을 찾을 수 있었다.
친구와 만나 편하게 대화하는 콘셉트에서 시청자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출처: 뜬뜬 유튜브 채널유튜브 토크쇼의 전성시대다. 유재석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친한 게스트를 초대해 이야기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있다. TV 토크 프로그램 중 시청률과 화제성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라디오스타>(MBC), <유퀴즈 온 더 블록>(tvN) 정도인 걸 감안하면 유튜브에서 토크쇼가 얼마나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반면 TV 예능은 여전히 관찰 예능이 대세다. TV 매체는 여전히 새로운 포맷의 기획보다 성공한 포맷을 변주하거나 스핀오프 형태의 안정적인 제작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개인의 취향이 점점 다양화되고, 콘텐츠의 소비패턴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요즘, <핑계고>의 독특한 기획 의도와 구독자를 끌어당기는 요소들은 탐구할 가치가 있다.